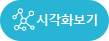| 항목 ID | GC60004895 |
|---|---|
| 한자 | 無等山-金道洙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문학 |
| 유형 | 작품/문학 작품 |
| 지역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 집필자 | 황민선 |
| 저자 몰년 시기/일시 | 1742년 - 김도수 사망 |
|---|---|
| 배경 지역 | 무등산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
| 배경 지역 | 원효사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514-35[금곡동 846] |
| 성격 | 한시 |
| 작가 | 김도수 |
[정의]
조선 후기 문신인 김도수가 전라도 광주 지역의 무등산에 있는 원효사를 방문하고 쓴 한시.
[개설]
「무등산(無等山)」을 지은 김도수(金道洙)[?~1742]는 조선 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청풍(淸風)이고 자는 사원(士源), 호는 춘주(春洲)이다. 음보(蔭補)로 공조정랑, 지례현감(知禮縣監), 통천군수, 금산군수 등을 지냈다. 노론·소론·남인·승려에 이르기까지 당색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많은 문인과 교유하였다. 저서로는 『춘주유고(春洲遺稿)』가 있다.
김도수는 시를 지으면서 "숙서석산원효사(宿瑞石山元曉寺) 여명상인담영은구유(與明上人談靈隱舊遊) 잉차기축중운(仍次其軸中韻)[서석산 원효사에서 묵으면서 여명 스님과 옛날 영은사를 유람하였던 일을 이야기하다, 이에 그 시축 가운데 운자를 차운하여 쓰다.]"라고 하였다. 문장 중에 있는 영은사는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에 있는 사찰로, 선운사(禪雲寺)의 말사이다. 636년 영은조사(靈隱祖師)가 창건하여 영은사라 이름하였다. 「무등산」의 배경이 되는 원효사는 송광사(松廣寺)의 말사로 무등산에 있으며, 삼국시대에 신라에서 창건한 사찰이다. 신라 문무왕 때에 원효(元曉)가 이곳에 머물면서 암자를 개축한 뒤부터 원효사·원효당·원효암 등의 이름으로 불렸다고도 하며, 고려 충숙왕 때 유명한 화엄종승(華嚴宗僧)이 창건한 뒤 원효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원효암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무등산」은 김도수의 문집인 『춘주유고』 권 1에 실려 있다.
[구성]
김도수가 지은 「무등산」은 1구에 7자씩 모두 8구로 이루어진 칠언율시이다.
[내용]
숙서석산원효사(宿瑞石山元曉寺), 여명상인담령은구유(與明上人談靈隱舊遊), 잉차기축중운(仍次其軸中韻). [서석산 원효사에서 묵으면서 여명스님과 옛날 영은사를 유람했던 일을 이야기하다, 이에 그 시축 가운데 운자를 차운하여 쓰다.]층라첩회소계류(層蘿疊檜小溪流)[덩굴과 전나무 무성한 사이 작은 내 흐르니]/ 증도산중차경유(僧道山中此境幽)[스님은 산중에 이 경치 그윽하다 말하네]/ 홍엽불방가엽조(紅葉不妨佳節早)[단풍 붉으니 좋은 계절 이른 게 싫지 않고]/ 황화환억거년추(黃花還憶去年秋)[국화꽃 피니 지난 가을이 생각나는구나]/ 우시객납래상하(于時客衲來牀下)[이때 객승이 침상 곁으로 들어오니]/ 요야풍란재전두(遙夜風鑾在殿頭)[긴 밤 풍경이 사찰 전각 머리에서 울리네]/ 휴침공담령은호(携枕共談靈隱好)[베개 잡고서 영은사 좋은 시절 이야기하며]/ 효창잔월위상유(曉窻殘月爲相留)[새벽 창 달빛 희미해질 때까지 함께 있었지]
[의의와 평가]
「무등산」은 김도수의 시 세계 일면을 알 수 있는 작품으로, 조선 후기 문인들의 무등산 유람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이다.
- 『춘주유고(春洲遺稿)』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김대현, 『무등산 한시선』(전남대학교 출판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