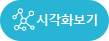| 항목 ID | GC01501079 |
|---|---|
| 영어음역 | Ttebae |
| 영어의미역 | Raft |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 유형 | 물품·도구/물품·도구 |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강경혜 |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해안가 수산물을 채취할 때 사용한 뗏목 형태의 배.
육지에서 200~300m에 이르는 해안가에서 미역, 다시마, 김, 곰피, 모자반 등을 채취하거나 오징어 낚시, 손꽁치잡이를 할 때 사용하였다. 일반 어선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바위 틈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배도 상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이나 여름에 주로 사용하였다.
1960년대 말까지는 울릉도에 오동나무가 많았고 제작방법도 단순해서 떼배를 많이 만들어 썼지만 지금은 잘 볼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떼배가 울릉 지역의 전통 민속놀이에 사용됨에 따라 복원되어 군 축제에 이용되고 있다. 매년 8월에 개최되는 울릉도 오징어 축제에서는 노를 저어서 도착점에 빨리 도달하는 ‘떼배 경주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를 주관하는 군내 11개 어촌계에서 각각 떼배를 제작하여 유지·관리해 오고 있다.
울릉도에서 떼배는 개척시기부터 사용한 것으로 동해안에서 사용한 떼배와 규모와 형태가 비슷하다. 제주도 떼배보다는 작고 단순하다. 직사각형으로 가로 3~4m, 세로 1.5~2m 가량 되며 노지게는 40㎝ 가량 된다. 떼배를 만들 때에는 가볍고 물에 잘 뜨는 버드나무나 오동나무를 쓰며 직경 30㎝ 가량 되는 것이 적당하다.
오동나무의 껍질을 까서 3~4m 길이로 자른 뒤 햇볕에 한 달 정도 말린다. 그 다음 두세 군데 장대를 박는데, 이때에는 비교적 단단한 고로쇠나무가 적당하다. 나무 앞과 뒤에 사각이나 둥근 구멍을 뚫고 장대를 박은 뒤 통나무를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배 끝에 노지게와 노좆 그리고 노를 단다.
배 위에는 물 칸이나 난간을 만들어 해조류나 물고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오동나무는 가볍고 물에 잘 떠서 떼배뿐만 아니라 어로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물에 띄워두는 뜸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곽유석 외, 『우리배·고기잡이』3(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2)
- 『울릉군지』 (울릉군지편찬위원회, 2007)
- 「울릉도, 동해안 어촌지역의 생활문화 연구」 (영남대민속문화연구소, 2005)
- 인터뷰(도동리 주민 김태환, 남, 51세)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