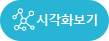| 항목 ID | GC06700006 |
|---|---|
| 한자 | 炭鑛-道溪給水塔 |
| 영어공식명칭 | Coal mine village Kkamak-dongne and Dogye water tower |
| 이칭/별칭 | 까막골 |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 지역 | 강원도 삼척시 |
| 시대 | 근대 |
| 집필자 | 최도식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40년 - 도계역 급수탑 설치 |
|---|---|
| 도계역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20-15
|
|
| 까막동네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111~122 |
[정의]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의 탄광마을 까막동네 및 도계역과 도계급수탑.
[개설]
한때 탄광 개발로 활황기를 누렸던 도계와 그 영화를 함께 누렸던 까막동네의 명암(明暗)과 도계역 및 도계 급수탑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담고 있다.
[삼척탄광 개발과 탄광마을 도계]
‘도계(道溪)’라는 소읍(小邑)을 들어보셨나요?
도계는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소읍이다. 도계는 이전에 ‘삼척군 소달면 도계리’였다. 그런데 이 작은 시골 마을이 읍이 되기까지에는 탄광 개발이 함께 했다.
1937년 6월 일본인 내등웅희(內藤熊喜)는 자본금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선무연탄주식회사(朝鮮無煙炭株式會社)로부터 광업권을 넘겨받아 삼척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삼척탄광(三陟炭鑛)과 삼척철도(三陟鐵道) 등을 경영한다. 당시에 탄광은 삼척탄광소달분광(三陟炭鑛所達分鑛)이었다. 지금은 폐광이 되어 자취를 감추었지만 소달면의 고사리를 중심으로 몇몇 갱들이 있었으며, 그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하나둘 몰려들었다. 이것이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삼척주식회사가 개광한 삼척탄광의 모태이다. 8․15 해방과 함께 삼척개발주식회사는 적산기업체[일제강점기 동안 국내에서 일제, 일본인이 소유한 기업체]로 분류되어 종업원이 자치제로 경영하였다. 그 후 미군정의 관리 하에 경영되다가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정부로 이관되어 상공부광무국(商工部鑛務局)의 관할로 운영되었다. 이후 삼척탄광은 1950년에 출범한 대한석탄공사에 이관되었으며, 탄광의 규모가 커지자 1951년 도계광업소와 장성광업소로 분리하였다. 도계광업소는 도계갱을 중심으로 동덕갱, 흥전갱, 나한갱, 점리갱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탄광 개발로 사람들은 자연히 일자리를 찾아 도계로 모이기 시작했다. 게다가 1950년대 이후 개인이 탄광을 개발하였으며, 상장탄광, 흥국탄광[지금의 경동광업소], 삼마탄광 등 여러 개인 소유의 광업소들이 문을 열게 되었다. 이처럼 도계는 강원도 내 석탄 생산량의 32%를 차지하는 중요한 석탄 산지가 되었으며, 1975년까지 서독에 파견하는 광부들의 훈련소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탄광을 중심으로 광산 취락도 발달하여 1950~1960년 사이에 인구가 세 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1963년에는 도계리가 도계읍으로 승격하였다. 1978년에는 흥전리에 3층 연립의 희망아파트가 건립되었는데, 이는 장성광업소의 화광아파트와 함께 탄광촌 아파트형 사택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늘어난 도계읍의 인구는 1980년 초중반에 6만 명에 육박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석탄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광업소의 규모도 축소되고 탄광촌에도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었다.
탄광 개발 초기부터 탄광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해 온 사람들은 도계읍에 자리를 잡았다. 특히 갱이 가까운 곳에 터를 잡아 거주하게 된다. 그래서 동덕갱이 있는 곳에 동덕초등학교가 생기고 흥전갱이 있는 곳에 흥전초등학교가 생겼으며, 점리갱이 있는 곳에 점리초등학교가 생겼고 나한갱이 있는 곳에 심포초등학교가 생길 정도로 인구는 증가했다. 그리고 갱이 있는 근처에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몰려와 살았고 선술집들도 하나둘 늘어났다. 도계갱에서 가장 가까운 도계읍 전두리의 갱 근처에도 사람들이 몰려와 터를 잡기 시작했는데 그곳이 지금의 ‘까막동네’이다.
[도계역 개통과 도계역 급수탑]
탄광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석탄을 도시로 나르고, 사람들 또한 왕래할 교통수단이 필요해졌다. 이에 영동선을 개통하게 된다. 영동선은 과거 묵호-철암 간의 철암선(鐵岩線)과 영주-철암 간의 영암선(榮岩線), 묵호-경포대 간의 동해북부선을 통합하여 지금에 이른다. 이들 노선은 주로 시멘트, 석탄 등과 같은 광물 자원의 수송을 위하여 건설되었다. 그 중 철암선의 경우 삼척철도주식회사에서 개통시킨 묵호항-도계 간과 도계-철암 간의 노선에서 비롯되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하여 국유화되었고, 현재 묵호항-묵호 구간은 묵호항선에 편입되어 있다. 초기 도계에서 통리까지 철로는 부설되지 않았다. 통리재 일대가 워낙 고도차가 커 철로 부설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강삭철도[케이블카]가 활용되었으며, 이후 스위치백이 활용된다. 강삭철도는 화차를 모두 분리하여 운반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승객은 열차에서 내려 고개를 걸어서 오르내려야 하는 방식이었기에 그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1963년 강삭철도를 폐지하고 스위치백을 활용한 우회 선로를 부설하였다. 이 스위치백 철로를 처음 탄 사람들은 갑자기 기차가 멈춘 다음 천천히 뒤로 가는 기이한 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나한정역과 흥전역을 잇는 스위치백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전에는 기차가 멈춘 후 뒤로 갈 때 승객들은 하나같이 창밖을 내다보며 신기함에 이야기꽃을 피웠다. 현재 영동선은 청량리역에서 출발하여 제천, 영주를 걸쳐 철암, 도계로 이어져 동해, 묵호를 지나 강릉에 종착역을 두고 있다.
도계역(道溪驛)은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에 위치한 영동선의 철도역이다. 도계역은 1940년 7월 31일 철암선도계역으로 개업한다. 도계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도계에서 묵호항으로 나르고 여러 도시들로 나르기 위해 개통된 역이다. 통리재의 고도 차이로 1963년에 강삭철도를 폐지하고 스위치백과 회(回)도는 우회 선로를 개설함으로써 1965년 10월 1일 사무관역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1984년 7월 역사 신축을 착공하였으며, 이때 신축된 역사를 일부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역사(驛舍)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스위치백과 회(回)도는 우회 선로를 폐지하고 동백-도계 간 솔안터널을 개통하여 통리역을 걸치지 않고 직통으로 도계역으로 들어온다.
도계역의 개찰구를 통과하면 대합실에는 석탄 채굴에 쓰던 광차가 전시되어 있고, 솔안터널 조감도가 눈에 들어온다. 솔안터널 개통 후 통리-도계 간 통리재에서는 흥전역과 나한정역은 폐역이 되고 도계역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도계역은 솔안터널을 통해 기차가 더 많은 사람들을 싣고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역 뒤편에는 도계광업소 선탄장을 비롯한 거대한 석탄 채굴 설비가 남아 있어 한때 도계의 영화롭던 시절을 말해준다.
도계역을 빠져 나오면 넓게 왕복 4차로의 광교(廣橋)가 펼쳐진다. 그 광교에 올라서면 마을을 통과하는 오십천 지류가 보인다. 그리고 아찔할 정도의 난간 위에 집들이 빼곡하게 지천을 따라 이어져 있는 광경은 실로 경이롭다 못해 ‘어떻게 저런 곳에 집을 짓고 살까’라는 두려움마저 안겨준다. 광교에서 도계역 쪽을 바라보면 특이한 시설이 눈에 들어온다. 도계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기찻길이 산꼭대기까지 수직으로 뻗어 있다. 선탄장에서 갱도까지 이어지는 광차용 인클라인이다. 통리-심포리를 이어주던 일반 철도용 인클라인은 수십 년 전 사라지고 흔적조차 찾기 어렵지만 도계에서는 탄광 설비로 인해 여전히 건재하다. 하늘로 솟구쳐 오를 듯 철도의 아득한 풍경에 경외감이 생긴다. 탄차가 아니라 은하철도999가 힘찬 경적을 울리며 나타날 것만 같다.
도계역 철로 근처에는 까막동네가 있다. 철로 건널목을 지나 까막동네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도계 급수탑이 있다. 도계역 급수탑은 1940년에 설치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급수탑으로 당시의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던 급수 시설로 특이한 급수탑 형식이다. 이 도계 급수탑은 다른 급수탑에 비해 키가 작은 것이 특징인데 높이가 8m 정도이다. 대개의 급수탑이 높게 건축되는데 비해 도계역의 급수탑이 낮게 건축된 이유는 철로 면보다 4m가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기에 적정 수압을 얻어낼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도계 급수탑은 2002년 등록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되었다.
[찬란했던 도계의 명암(明暗)과 까막동네]
‘까막동네’는 ‘까막골’이라고도 하는데 전형적인 탄광촌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옹기종기 모인 밀집형의 집들과 철도 건널목을 중심으로 마름모 형태의 취락 지구를 형성하고 있다.
1980년대 초 ‘까막동네’에는 140여 가구가 거주할 정도로 좁은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도계에는 ‘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상권은 활기가 넘쳤으며, ‘도계는 봄날’[돈 걱정 없는 살던 시절]로 읍내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밤을 밝히며 번성해 나갔다. 까막동네도 그 번성을 함께 누렸다. 좁은 동네에 덕지덕지 조밀하게 집들이 들어찼으며, 구멍가게며 부식가게가 들어섰고 선술집도 두어 군데 들어섰다. 갱에서 하루 일을 마친 광부들은 집보다 어김없이 이 선술집에 들러 대포 잔을 걸치며 고된 광부의 일과를 마무리했다.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리라는 마음으로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하나둘 몰려 온 사람들은 이곳을 고향이라 생각하며 살았고, 술잔이 오고 갈 때마다 젊은 시절의 경험담을 안주삼아 그들만의 시름을 달래었다.
까막동네는 140여 가구가 거주하지만 내 집 네 집이 따로 없었다. 이곳 여인네들은 수시로 내 집과 네 집을 들락날락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며 살았다. 조금이나마 형편이 나아지면 그것을 함께 기뻐했고, 남보다 그나마 형편이 나아질 때면 없는 사람이 자녀의 등록금이 없다며 돈이라도 빌리러 오면 거절하지 않고 선뜻 돈을 빌려주었다. 그렇게 친형제처럼 친이웃으로 함께 살아갔다. 더욱이 집집마다 그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서로의 왕래가 빈번하여 동네 사람들은 서로가 온정을 느끼며 살았다. 어쩌다 아이들이 싸우는 날이면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다치지 않았는지를 먼저 걱정했고 이웃집에 아픈 자식이라도 있으면 좋은 약을 구해 그 집에 주기를 서슴지 않았다.
세월의 그림자는 까막동네에도 드리워져서 까막동네는 까맣게 변해갔다. 동네를 지나면 바로 도계갱이 눈에 들어왔고 고개를 들어 위를 보면 저탄장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 갱과 저탄장에서 날리는 먼지로 까마동네의 지붕이 까맣게 변하는 기이한 현상도 생겨났다. 슬레이트 지붕들이 까맣게 변해가는 동안 까막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했다. 1986년 이후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까막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갔다. 까막동네에 살던 아들, 딸들도 점점 성장하며 도회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갔다. 그렇게 떠나간 빈 집이 허물어졌고 빈집의 대문이 꼭꼭 잠겼다. 남은 사람들은 까막동네의 세월을 머금은 보르크[시멘트 벽돌] 담장처럼 깎이고 헤어져 남겨졌다.
‘까막동네’ 탄부 출신 김아무개씨는 “1970년대만 해도 인구가 6만에 육박했지. 당시에는 도계를 ‘팔도공화국’이라 불렀어. 전국 팔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라고 회상한다. ‘까막동네’란 동네 이름은 탄광의 흔적이다. 탄광이 개발되면서부터 새까만 석탄가루로 뒤덮인 마을이었기 때문이다. 저탄장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 담장과 지붕, 심지어 콘크리트 바닥, 텃밭의 땅도 새까맣다. 까막동네는 딱 한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로 좁은 골목길이 이리저리 이어지고 낮은 지붕 처마가 눈높이와 같다. 최근 ‘2012년 도계읍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조형물도 생겨나고 유리로 만든 문패도 달렸다. 옆 도계갱에서 날리는 석탄가루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검은색 페인트로 칠하기도 했다. 그리고 세월을 머금은 보르크[시멘트 벽돌] 담장에 벽화도 그려졌다. 그렇다고 남은 사람들의 자리는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담장이 벽화로 바뀌기보다는 세월을 머금은 채 그렇게 회백색의 ‘까막동네’로 남았으면 한다. 이름과는 달리 까막동네는 골목길이 참 예쁘다. 탄가루가 달라붙은 담벼락은 거무튀튀해도, 이리저리 휘고 굽은 골목길은 그야말로 ‘골목의 원형’을 보는 듯하다. 이제 ‘까막동네’는 탄광촌의 소중한 유물이다. 이 땅의 석탄 산업을 이끌었던 탄부들의 생활 터전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 ‘까막동네’이다. 까막동네를 찾아 지난 세월의 흔적을 한번 밟아 보기를 권한다.
[폐광 이후, 삶이 남긴 기억의 자리]
시커먼 탄가루를 뒤집어쓴 도계역 뒷산에서는 여전히 석탄을 캐낸다. 도계광업소가 문을 연 것이 1936년부터니까 82년[2018년 기준]째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영화로웠던 탄광도시의 면모를 찾기란 쉽지 않다. 석탄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1989년 이후 탄광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도계의 봄날’도 여기까지였다. 한때 인구 6만에 이르렀던 탄광 도시 도계는 인구 1만 2000여 명의 소읍이 되었다.
도계 사람들에게 탄광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도계읍 흥전리 ‘도계 유리마을’의 유리공예가인 도계 토박이 김수미씨는 탄광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도계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 도계에서 태어나 대학 시절을 제외하고 줄곧 도계를 떠나지 않았다는 김수미씨의 부친 역시 탄부였다. 활황기 시절 가장 잘나가던 도계의 모습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탄광은 언제나 삶의 곁에서 함께 했다. 현재 하고 있는 유리공예 역시 도계에서만 나온다는 석탄의 잔류석[폐석]을 유리 원료로 쓰고 있다. 발열량이 낮아 버려졌던 폐석탄이지만 사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매혹적인 초록빛의 유리 제품으로 탄생할 수 있다고 한다.
도계에 남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꿈꾼다. 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은 도계를 배경으로 한 영화다. 탄광 도시의 해체 위기에 몰린 중학교의 관악부를 소재로 한 이 영화는 쇠락해가는 탄광촌에 희망을 담아내며 잔잔한 재미와 인간애의 감동을 주었다. 누군가 말했듯이 사람이 떠나갈 때는 단순히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도 떠나간다. 나날이 쇠퇴해가는 석탄 산업의 흐름에서 도계읍도, 까막동네도 예외일 수는 없으니 여전히 사람만이 희망이리라. 우리는 여전히 막장 인생에도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바란다. 지금 도계 사람들은 따스한 봄날의 꿈을 꾸고 있다.
- 『삼척군지』(삼척군지편찬위원회, 1985)
- 삼척시립박물관, 『탄광촌 사람들의 삶과 문화』(민속원, 2005)
- 신명식, 『간이역 오감도』(이지북, 2010)
- 김정경 편저·배재홍 옮김, 『삼척향토지』(삼척시립박물관, 2016)
- 「시간이 멈췄다 심장이 멈춘다」(『서울신문』, 2016. 7. 1.)
- 「이야기가 있는 소읍 기행」(『주간조선』, 2017.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