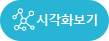| 항목 ID | GC04300005 |
|---|---|
| 분야 | 생활·민속/민속,문화유산/무형 유산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 집필자 | 한정수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64년 12월 7일 - 양주별산대놀이, 국가 무형 문화재 제2호로 지정 |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80년 11월 17일 - 양주소놀이굿, 국가 무형 문화재 제70호로 지정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98년 9월 21일 - 「양주 상여와 회다지 소리」, 경기도 무형 문화재 제27-1호로 지정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06년 3월 20일 - 양주농악, 경기도 무형 문화재 제46호로 지정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10년 9월 7일 - 「양주 들노래」, 양주시 향토 문화재 제18호로 지정 |
[개설]
경기도 양주시에는 지역민들이 전통 사회로부터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삶과 농경 관련 놀이와 굿, 농악, 소리 등이 있다. 양주의 신명과 흥을 대표하는 양주소놀이굿[국가 무형 문화재 제70호], 「양주 들노래」[양주시 향토 문화재 제18호], 양주농악[경기도 무형 문화재 제46호], 양주별산대놀이[국가 무형 문화재 제2호], 「양주 상여와 회다지 소리」[경기도 무형 문화재 제27-1호] 등이 이것이다. 이들은 각기 그 전통성과 원형성을 인정받아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각기 체계적 전수 교육과 정기 공연을 통해 그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 속에는 말 그대로 양주 지역민들의 생산 활동 진작과 삶의 기쁨 및 슬픔이 깃들어 있다. 그 다섯 마당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 보았다.
[그들의 이야기 #1 - 소와 무당·마부, 그 어울리지 않는 어울림-양주소놀이굿]
커다란 황소를 끌고 나온 마부(馬夫)와 이색적이라 할 무당이 만난다? 만남 자체도 뭔가 어울리지 않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더더욱 어색하지 않을까? 그들의 이야기가 신명나는 양주소놀이굿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본래 소놀이굿이란 소와 말을 숭배하는 ‘소멕놀이’에 기원을 두고, 농사 풍년, 사업 번창, 동네 평화 등을 이루고 악귀를 쫓으며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굿을 말한다. 그럼, 그 주인공들은 누구일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 못하는 짐승, 송아지와 소이다. 소는 누가 자기의 얘기를 들어 달라 한다. 그 얘기를 듣고 말해 주는 이가 있다. 바로 마부와 만신(卍神) 무당이다. 그러니까 소놀이굿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실제 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자.
삐리리, 땅땅, 꽹꽹, 좋다~ 농악 소리가 마을 입구에서 울려 퍼진다. 소리만 들으면 여느 농악과 비슷하다. 그런데 소와 마부, 그리고 만신 무당이 등장하여 길을 열면서 길놀이가 시작된다. 송아지는 만신에게 입 맞추며 마당을 뛰어 논다. 소도 만신과 사람들에게 다가선다. 마부와 만신의 이야기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만신은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석거리를 만수받이 소리로 올린다. 에~혀 풍년을 비옵니다…… 그리고 만신과 마부의 재담(才談)과 해학(諧謔)은 도대체 끝날 줄 모른다. 「마부 타령」과 소의 「마모색 타령」이 지나 소 흥정의 장이 되면 양주소놀이굿은 절정에 다다른다. 소의 건강, 똑똑한 지 여부를 얘기하며 소 매매가 성사되면, 만신은 소를 산 집을 위해 치성을 드린다.
이처럼 양주소놀이굿은 소를 매개로 하면서 추수 감사와 풍년 기원과 재액(災厄)을 막는 농경의례이자 굿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추수 후나 동짓달, 정월에 마을에서 정말 신명나게 올려졌다고 한다. 1980년 11월 17일 국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후 양주소놀이굿보존회에서는 전용 회관과 놀이마당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농번기로 들어가는 5월을 중심으로 신명을 울려 풍년과 무사함을 기원하고 있다. 시대는 변했지만 그러한 바람은 오늘도 농사일로 연결된다. 이제 「양주 들노래」가 울릴 차례이다.
[그들의 이야기 #2 - 땅과 사람의 교감, 그 신명나는 소리-「양주 들노래」]
‘신토불이(身土不二)’! 한 시대를 풍미했던 표어였다. 그렇다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의미는 적어진 면이 있다. 우리 땅, 우리 농산물 그것들은 어떤 손길을 기다리고 어떤 즐거움을 주는가. 여기 「양주 들노래」에는 그러한 교감이 흥으로 그리고 신명으로 흠뻑 스며들어 있다. 양주들로 나가 농꾼들과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며 땀을 흘려보자. 진정한 신토불이가 느껴지리라.
당연한 것이지만 농사는 들에서 한다. 그늘도 없는 논에서 뙤약볕을 맞아야 한다. 허리는 반쯤 굽히고, 발목은 논뻘에 잠겨 움직이기도 힘들다. 손바닥보다 조금 더 자란 모를 잡고 ‘이제 시작하면 언제 저 너머로 가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은 농사의 고단함 때문이리라. 거머리가 달라붙어도 잡초인 피를 뽑아야 한다. 한 올이라도 더 수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태풍에 넘어진 벼이삭을 눈물 흘리며 일으켜 세워야 한다. 낟알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은 벌써 앞서 간다. 일확천금(一攫千金)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닌데도 그래도 농사는 아직까지는 그냥 해야 하는 천직(天職)과 같은 것이다.
농사가 점점 기계화되고 줄어들고 있는 요즘, 막걸리 냄새나는 땀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농사지으며 흥을 돋아 농사의 어려움을 이겨내던 그 농요들도 따라서 없어지고 있다. 그러나 양주시에서만큼은 들농사에서 나직하지만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의 소리로 울려 퍼진다.
“쪘네, 쪘네, 모를 쪘네” 하면 어느새 모를 찌었고, “하난야 둘이로구나 둘이면은 서이라” 하면 어느 사이엔가 모내기가 반쯤 끝나 있다. 새참이 나온다. 상추와 고추, 그리고 보리밥과 된장, 막걸리. 이거면 요즘말로 끝짱난다. 에혀~ 농자천하지대본이로구나. 그래도 수확 때 되면 낟알 하나라도 챙겨 먹으려는 날짐승들 몰려온다. 쫓아야지 하며 어느 샌가 나는 소리, “위야 훨훨, 위야 훨훨”이다.
「양주 들노래」는 양주 농꾼들의 피와 땀이 진하게 엉겨 있는 농요이다. 그 소리는 우리네 조상님들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들으면 우리 유전자는 어느 샌가 저절로 움직여 하나가 된다. 그리고 깊은 곳에 있던 조용한 율동은 갑자기 천지간에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크게 움직이고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 양주농악이 흥을 넘어 신명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야기 #3 - 흥을 돋자, 풍년을 위한 락Rock樂-양주농악]
양주 백석 들녘 곳곳에 삼색 고깔과 꽹꽹 꽹과리 소리, 쨍쨍 제금 소리, 징징 징 소리, 따땅 따당 장구 소리, 땅 따당 북 소리, 또동 또도동 소고 소리, 삐리리 태평소 소리가 어울리고 있다. 푸른 논 들녘 사이로 그들이 몰려오면, 귓전을 울리는 소리에 머리가 멍멍해진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 울림은 몸을 울리기 시작한다.
그렇다. 양주농악대가 농사 흥을 돋우기 위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흰 베옷에 삼색 고깔모자와 삼색 띠를 두른 그들의 어울림이 시작된다. 일하던 이들 더욱 뻘뻘 땀 흘리다가 한 숨 쉬는 사이 농악대와 어울리면 좋으련만 좋~다라 추임새만 넣는다. 그런데 양주농악대 사이로 묘한 사람들이 끼어들었다. 그들을 보면 양반 차림새도 있고, 아낙도 있고, 무동도 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온 듯하다. 에혀, 그들도 하나 되어 노는데, 잠시 숨 돌리며 흥을 돋은 들 또 어떠랴 싶다. 그러자면 막걸리 한 사발, 두 사발은 물론 기본으로 들이켜야 하리.
양주농악은 농사짓는 과정을 상쇠의 쇳소리에 따라 법구잽이가 춤과 율동으로 이어가고, 농요로 모심는 소리, 김매는 소리 등 농사풀이를 겸하고 있다. 농악과 춤, 소리가 어우러지는 것이다. 양주농악, 이렇게 흥겨움을 주는데, 그 역사를 잠깐 보자. 농악의 뿌리는 당연히 매우 오래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양주농악이 본격적으로 조명된 것은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레패를 통해 두레농악을 행하던 당시 양주군 회천동의 농악이 주목되어 1903년(고종 40)에 농상공부로부터 권농을 장려하는 농기를 받았던 데서 부각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접어들어 다시금 양주농악 보존의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때로는 놀이마당에서 정기적 공연을 하고,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양주농악은 양주 마을에서 들에서 듣고 같이 어울려야 제 맛이 난다. 이렇게 보자니 양주농악은 뙤약볕에서 건강하게 그을린 얼굴과 땀, 소리는 농사일을 하는 즐거움을 보여 주고, 천지를 울리면서도 사람의 심신을 움직이게 하는 Rock이 느껴지며, 농부들의 하늘인 농사를 즐거워하는 락(樂)이 담겨 있음이 느껴진다.
[그들의 이야기 #4 - 고~연, 고~연지고 VS 놀이는 놀이일 뿐-양주별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 어디선가 한번쯤은 들어봤던 단어이다. 양주를 대표하는 산대놀이이자 대한민국의 전통 공연 문화의 정수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놀이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마당에는 농사일을 잠시 내려놓은 양주들에서 벌어지는 신명나는 별산대놀이를 즐겨 보자. 옛날에는 사월 초팔일도 좋고, 단오 때도 좋고, 추석 명절이라도 시절 좋으면 열었다. 하지만 이제는 5월 5일 정기 공연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상설 공연을 하고 있다. 물론 전국 공연은 언제라도 환영이라 한다. 주 장소는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장이다.
본래 산대놀이는 궁중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무대에서 노는 연희였다. 별산대놀이는 이러한 산대놀이에서 떨어져 나온 분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만큼 더 서민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먹중이나 옴중 같은 파계승과 상좌, 샌님 같은 양반, 포도부장, 무당, 하인, 미얄할미, 신할아비 등이 등장하면서 엄격한 계층 논리가 지배한 양반 사회에 대한 현실을 풍자하고 해학으로 풀어내고 있다. 양주별산대놀이에 참여한 놀이꾼과 소리꾼의 해학을 통해 양주 사람들은 그 순간만큼은 양반의 권위에서 해방되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그 느낌 그대로야 아니겠으나,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양주별산대놀이는 알아듣지 못할 부분이 조금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웃음 가득하고 신명난다. 그런데 이런 신명나는 산대놀이에는 마지막 진오귀굿에서 관련한 설명에 보이듯이 에피소드가 전한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가면을 좋아하였는데 전염병에 걸리자 무당이 가면 때문이라 한 얘기를 듣고 가면을 들에 버리자 병이 나았다. 그런데 가족 중 한 사람이 우연히 그 가면 위에 피어난 버섯을 삶아 먹고는 갑자기 웃으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 다음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그러했다.”라 한다. 왜 그랬냐는 물음에 “처음 먹자마자 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한 대답을 보면, 가면의 신비로우면서도 주술적 힘을 느끼게 된다. 그런 탓인지 양주별산대놀이에 쓰이는 탈들을 보면 그런 주술적 힘이 느껴진다. 그 해학 역시도 가면에 그대로 드러난다. 왜장녀탈, 샌님탈, 포도부장탈, 옴중탈, 미얄할미탈, 신할아비탈 등이 그것이다. 가면 속에 감춰진 얼굴들이 말하는 이야기 중 약간을 들어보자.
먼저 길놀이로 시작되는 장면에서의 고사 지내는 말을 보면,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 양주, 별산대놀이 공연장에서 여러 선생님네 들을 모셔 놓고 각종 제물 진설하고 제 지내오니 탁주 일 배라도 잡수시고 고이 돌아가소서, 자, 북어, 술 한 잔에 고사 합니다.”라 하면서 “김 선생이요, 박 선생이요, 이 선생이요, 각인각성 열에 열 명 있드래도 어른, 애, 노인, 할 것 없이 산대굿 구경하신 후에 댁에 돌아가셔도 뉘도 없고 할도 없게 도와 줍소사 ~ 상향.”으로 맺는다.
이로써 시작된 별산대놀이는 순식간에 넋타령으로 맺음을 하고는 놀이꾼과 모든 즐기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음식을 먹고 막을 내리게 된다. 마지막 과장에서 누이가 한 ‘잠깐 잠깐 놀다가마’라는 추임새의 효과라고나 할까 모두가 하나가 되는 장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곧 해학과 풍자가 끝나면 휑한 마음이 든다. 삶이 일단락된 듯하다. 하지만 곧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된다. 그것은 아련히 허공에 떠서 듣는 상여 소리와 회다지 소리리라……
[그들의 이야기 #5 - 잘 가시오 잘 가시오, 어헤여라 달고 - 「양주 상여와 회다지 소리」]
장례 의식 노래와 의식도 공연이 될 수 있을까? 참, 아이러니한 질문이다. 죽음을 다루는 의식을 공연하다니! 그런데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고릉말 「양주 상여와 회다지 소리」는 그러한 질문을 무색하게 만든다. 어떤 특별한 내용과 의미가 있어서일까? 그렇다. 「양주 상여와 회다지 소리」는 자연스레 생긴 것이기는 하지만 조선 시대 왕릉을 조성할 때 역을 짊어졌던 사람들에 의해 전승된 장례 절차와 소리가 녹아 있기 때문이다. 그럼, 한 번 그 의식과 소리를 따라 가보자.
서양에서는 장례식 때 시신 운구를 위해 최고의 차라 할 롤스로이스를 움직인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지금은 매우 적어졌지만 꽃가마 상여이다. 형형색색의 만장(輓章)을 앞세우고 수십 명의 상여꾼이 전후좌우에서 어깨에 상여를 맨다. 그리고 선소리꾼의 선창에 따라 소리를 낸다.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이승과의 이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여 소리」이다. 장지에 도착한 상여 행렬이 관을 내리고 봉분을 할 자리를 다지기 위해 달구질하며 부르는 소리와 행위가 있다. 바로 「회다지 소리」 즉 「달구 소리」이다. 이처럼 「양주 상여와 회다지 소리」에는 죽은 이에 대한 애도와 상여를 운반하고 무덤을 만들기 위해 땅을 다지는 이들의 호흡을 고르고 흥을 돋기 위한 노동요의 성격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양주 상여와 회다지 소리」는 실제로도 꾸준하게 불리고 있다. 과거 백석면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레 소리 전승뿐만 아니라 상장례 용품의 전승에도 힘썼다. 「상여 소리」를 보면 ‘오호 어헤’를 소리와 길이 등을 달리하면서 반복하여 호흡 고르기가 이루어진다. 「회다지 소리」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설과 「회심곡」, 「역설가」, 「꽃방아 타령」, 「새날리는 소리」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 소리를 들어보자. ‘간다 간다 날아를 간다 사방팔방으로 날아를 간다 우야 훨훨’이라 한다. 죽은 자의 영혼은 그렇게 가게 된다.
인간 세계의 죽음을 다루는 의식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전통 사회에서 그것은 ‘느림’이었다. 답답하리만큼 의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절차를 마련하고, 절차대로 의식을 진행하였다. 「양주 상여와 회다지 소리」는 그러한 느림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울림으로 남아 있게 된다. 죽음은 또 다른 생의 시작이기에……. 양주의 신명과 흥은 이렇게 죽음으로 소멸되는 듯하지만 인간의 삶이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흙에서 태어나듯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된다. 양주 사람들은 「양주 상여와 회다지 소리」를 통해 이를 깊은 여운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 『양주군지』 (양주문화원, 1992)
-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양주군, 1998)
- 김헌선 편, 『양주 상여와 회다지소리』(월인, 2006)
- 양주소놀이굿(http://www.sonory.com/)
- 양주들노래(http://www.deullorae.com/)
- 양주농악보존회(http://www.yangjunongak.com/)
- 양주별산대놀이(http://www.sandae.com/)
- 양주상여와회다지소리(cafe.daum.net/yangjusangyeohoeda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