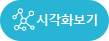| 항목 ID | GC08800043 |
|---|---|
| 한자 | 平野 |
| 영어공식명칭 | Plain |
| 분야 | 지리/자연 지리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최원회 |
[정의]
충청남도 보령 지역에 있는 기복이 적고 평탄하며 비교적 낮은 지형.
[개설]
평야(平野)는 지형적 특징에 따라 퇴적 평야와 침식 평야로 나눌 수 있다. 퇴적 평야는 하천의 퇴적 작용에 의해 형성된 하성((河成) 퇴적 평야와 바다의 퇴적 작용에 의해 형성된 해성(海成) 퇴적 평야로 구분된다. 침식 평야는 암석이 침식을 받아 평탄해진 지형으로 준평원(準平原), 산록완사면(山麓緩斜面) 등이 있다.
[현상]
우리나라의 주요 평야는 대부분 퇴적 평야이며, 퇴적 평야의 핵심부는 대하천 하류에 토사가 쌓여 이루어진 범람원(氾濫原)이다. 대하천 하류의 범람원은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부터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지형이다. 이러한 범람원은 빙기에 깊게 파였던 골짜기에 하천의 토사가 현재의 해수면을 기준으로 퇴적됨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람원의 높이는 10m 내외로 매우 낮다.
한국의 평야는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평야의 핵심부는 대개 하천의 토사가 쌓여 이루어진 범람원이고, 평야에서 ‘들’이라고 불리는 곳은 거의 전부 이러한 범람원이다. 평야 주변의 구릉지, 즉 야산도 기복이 아주 작으면 평야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구릉지는 여러 측면에서 범람원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하천의 범람에 의한 침수의 위험이 없을 뿐 아니라 대개 기반암의 풍화토인 적색토로 덮여 있고, 밭·과수원·목장·임야 등으로 이용된다. 구릉지의 논은 언덕과 언덕 사이의 골짜기, 즉 바닥이 깊어 물을 대기 쉬운 ‘고래실’에 주로 분포한다. 구릉지가 삼림으로 덮여 있으면, 기복이 아무리 작아도 주민들은 이를 ‘산’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평야는 바다에 면해 있느냐 또는 바다로부터 격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지형의 구성이 달라진다. 한강 하류의 김포평야, 금강 하류의 논산평야, 낙동강 하류의 대산평야 등은 범람원만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평야는 산지나 구릉지로 둘러싸여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이와 달리 조차가 큰 동진강 하류의 김제평야, 만경강 하류의 만경평야, 안성천 하류의 평택평야, 삽교천 하류의 예당평야 등은 하천 양안의 범람원과 간척지로 이루어졌으며, 이곳에서는 방조제가 바다 쪽 경계의 구실을 한다. 방조제는 낙동강 삼각주로 형성된 김해평야에서도 볼 수 있다.
[특성 및 분포]
후빙기 초기의 익곡(溺谷)[지반의 침강이나 해면의 상승으로 육지에 바닷물이 침입하여 해안에 생긴 골짜기] 만입지(灣入地)는 점차 메워지면서 만입지 자리에 간석지(干潟地), 사구(砂丘), 사취(砂嘴)[모래가 해안을 따라 운반되다가 바다 쪽으로 계속 밀려 나가 쌓여 형성되는 해안 퇴적 지형. 한쪽 끝이 모래의 공급원인 육지에 붙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등의 지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조차(潮差)가 크고 만입지가 많은 보령 지역에서는 특히 넓은 간석지가 발달하였다. 간석지는 계속 성장하게 되면 고도가 높아져서 보통의 사리 때에는 물에 잠기지 않아 염기가 많은 환경에서도 견디는 염생식물(鹽生植物)이 성장하는 염생습지가 내륙 쪽으로부터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염생습지를 보령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농경지로 이용해 왔는데, 이것은 일종의 해안 평야 지형이며, 동시에 바다의 퇴적 작용에 의해 형성된 해성 퇴적 평야이다.
보령 지역에서 해성 퇴적 평야 형태의 해안 평야는 남곡동평야, 웅천읍 독산리평야, 간사지들[오천면 원산도 북부 해안], 노천들[웅천읍 노천리], 신현들[천북면 신죽리] 등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해안 평야는 대부분 간척되어 논으로 변한 간척 평야에 해당한다.
특히 남곡동평야는 외부에서 유입하는 하천이 없고 골짜기가 바다 쪽으로 열려 있는 전형적인 해안 충적 평야이다. 남곡동평야의 퇴적층은 해수면 변동과 관련되어 형성되었으며, 길이 약 3㎞, 최대폭은 약 1㎞로 천정천(天井川)[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아주 작은 하천]이 된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다. 평야의 상류 지역 맨 아래층은 화강암 풍화층이다. 남곡동 주변 산지가 모두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 화강암의 풍화토가 기반층을 이루고 있었다. 풍화토 기반층 위에 약 1m 정도의 단단한 얼룩무늬층이 나타나며, 얼룩무늬층 위에는 회색~암회색의 이토층(泥土層)을 주축으로 사질(沙質) 이토, 이질(異質) 사토(沙土) 등 세립질의 퇴적물이 식물의 유체를 다량 함유하고 퇴적되어 있었다. 중앙부에는 1m 정도의 토탄층(土炭層)도 퇴적되어 있었다. 토탄층 위에는 이토질로 되어 있었고, 마름화석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남곡동의 하부 충적 평야 표층은 아직 굳지 않은 사질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고, 하부는 점토질 퇴적물, 즉 머드(mud)로 퇴적되어 있다. 하부 충적층은 상부에 비해 극히 평탄한 것이 특징이다. 후빙기 해수면 상승 때 본 지역은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소하천에 의해 운반된 물질과 바다가 운반한 물질이 합해져 퇴적되었다. 이때 점토질 퇴적층이 형성된 것이다. 점토질 퇴적물이 점차 골짜기를 메우고 골짜기 입구에 사구가 만들어지면서 바다와 격리된 후 석호(潟湖) 환경이 되었고, 주변 산지의 사질 퇴적물이 소하천에 의해 운반 퇴적되어 현재와 같은 지형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웅천읍 독산리평야는 서해안에 면해 있으나 소황사구에 의해 가로막혀 파랑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 간척 사업이 이루어져 논으로 이용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반암 풍화층 위에 자갈층이 덮여 있고, 자갈층 위에 0.5m 내외의 토탄층이 있다. 토탄층 위로 암회색 머드, 실트(silt)[모래와 찰흙의 중간 굵기인 흙]층이 2m 정도 나타나며, 최상부에는 실트질 모래층이 나타난다. 바닥의 자갈층은 모난 자갈이기 때문에 바다에 의해 퇴적된 것이 아니고 빙하기 저해수면 상황에서 침식되면서 운반되어 쌓인 것으로 보인다. 자갈층 위에 있는 토탄층은 주로 목본의 뿌리, 줄기, 잎, 열매 등으로 되어 있는데, 목본의 뿌리는 모두 수직으로 박혀 있어 현지에서 자라다가 토탄화된 것으로 보인다.
- 『보령시지』상(보령시지편찬위원회, 201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평야(平野)